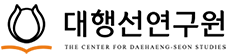15집 한국불교의 지관 수행과 그 활용 / 김방룡(충남대학교 교수)2025.08. 15집(403 - 448)
김방룡(충남대학교 교수) 2025.08. 15집(403 - 448) 10.23217/jhms.15..202508.010
본문
초록
본고는 대행선과 주인공 관법의 불교사상적 연원을 지관 수행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찾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대행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사 가운데 한 분으로 독자적인 선풍을 통하여 불교 대중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대행의 주인공 관법은 한국불교의 지관 수행 전통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 남방불교의 사마타-위빠사나 수행은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주로 중국 남북조 시대 형성된 지관수행의 전통이 한국불교에 영향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본고에서는 지관 수행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수용되어 왔고, 역사를통하여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천태 지의의 법화사상은 6세기 백제의 현광玄光에 의해 유입되었지만, 지관 수행의 한국적 수용은 7세기 원측圓測과 원효元曉에 의하여이루어졌다. 원측의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와 원효의 기신론소起信論疏에서 지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살필 수 있다. 나말여초 선종이 유입된 이래 한국불교에 있어서 지관 수행은 선수행에 밀려 주된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고려 초 오월과북송에 천태 전적을 전한 제관諦觀은 천태 지의의 사상을 정리하여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를 저술하였는데, 여기에는 십경십승관법十境十乘觀法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지눌知訥은 돈오점수頓悟漸修와 더불어 정혜쌍수定慧雙修를 강조하였는데, 그의 정혜쌍수는 지관 수행의 변용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 활약한 월창거사月窓居士 김대현金大鉉은 선학입문을 통하여 달마선과 더불어 천태선을 강조 하였는데, 천태선은 다름 아닌 지관수행이다. 이와 같이 한국불교에 있어서 지관 수행의 수용과 전개는 조사선과 간화선의 유행 속에서 빛을 발하지는 못했지만 7세기 이후 면면히이어져 왔다. 대행의 주인공 관법은 이러한 한국불교의 지관수행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정체성은 조사선과 간화선의 전통 속에서 찾아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begin a critical inquiry into the Buddhist philosophical origins of Daehaeng Seon and its practice of Juingong meditation, in addition to their interconnectedness with the practice of zhiguan (⽌觀; calming and contemplation/ samatha and vipassana). Master Daehaeng was one of the most prominent Seon masters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Buddhism, and through her unique Seon style, sh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Therefore, Daehaeng’s Juingong meditation needs to be examined within the zhiguan practice tradition of Korean Buddhism. Until the 2000s, Southern (Theravada) Buddhism’s practices of samatha and vipassana had little influence on Korean Buddhism, while the tradition of zhiguan practice—developed during China’s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can be said to have had a primary impact on Korean Buddhism over centuries.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how and by whom zhiguan practice was adopted into Korean Buddhism and how it has developed throughout history. The Tiantai School’s Master Zhiyi developed a comprehensive philosophy based on the Lotus Sutra, which was later introduced to Korea by the Baekje Kingdom’s Hyeongwang in the 6th century. However, the complete adoption of zhiguan practice in Korea was only achieved in the 7th century by the Silla monks Woncheuk and Wonhyo. Specific references to zhiguan practice can be found in Woncheuk’s Haesimmil-gyeongso (解深密經疏,Commentary on the Saṃdhinirmocana Sūtra), and Wonhyo’s Gisinronso (起信論疏, Commentary on the Awakening of Faith). Since the introduction of Seon Buddhism in the late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s, the practice of zhiguan has not been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 major practice in Korean Buddhism, being overshadowed by Seon practice. Jegwan—a Goryeo monk who transmitted the classics of the Tiantai School to Wuyue and the Northern Song Dynasties in the early Goryeo period—organized Master Zhiyi’s ideas and wrote Cheontae sagyo ui (天台四敎 儀, Outline of the Four Tiantai Teachings), in which he introduced in detail the teaching of “ten objects and ten methods of contemplation.” In addition, the eminent Goryeo monk Jinul emphasized the dual cultivation of concentration and wisdom, along with the concepts of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cultivation. His dual cultivation of concentration and wisdom can be said to be a variation of zhiguan practice. Kim Dae-hyeon —a lay practitioner active in the 19th century with the Dharma name Wolchang—emphasized Cheontae Seon along with Bodhidharma Seon in his book Seonhak ipmun (Introduction to Seon Studies), and the Cheontae Seon he refers to is none other than zhiguan practice. Thus, the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zhiguan practice in Korean Buddhism—though not as prominent as the prevailing practices of Patriarchal Seon and Ganhwa Seon—has continued uninterrupted since the 7th century. While Daehaeng’s Juingong meditation can be said to have inherited and developed the tradition of zhiguan practice in Korean Buddhism, its true origin and identity must be sought within the traditions of Patriarchal Seon and Ganhwa Seon.
목차
Ⅰ. 들어가며Ⅱ. 한국불교와 지관 수행
Ⅲ. 지관 수행의 한국적 수용
1. 원측의 지관 수행
2. 원효의 지관 수행
Ⅳ. 지관 수행의 한국적 전개
1. 제관의 십승관법
2. 지눌의 정혜쌍수
3. 김대현의 지관 수행
Ⅴ. 나오며: 한국 지관 수행의 특징과 그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