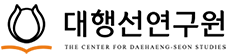15집 불타의 무아설無我說 재검토 / 남수영(능인대학원대학교 부교수)2025.08. 15집(183 - 228)
남수영(능인대학원대학교 부교수) 2025.08.. 15집(183 - 228) 10.23217/jhms.15..202508.005
본문
초록
불타의 무아설은 불교의 가장 독특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이다. 무아설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선행 연구가 있지만 거기에는 아직 풀지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1) 『전법륜경』 등에서 부정된 자아와 『대반열반경』 등에서 설해진 자아는 어떻게 다른가? 2)불타가 『대반열반경』 등에서 자아를 설하면서도 그 존재를 승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들이다. 논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타 당시 바라문교와 육사외도의 학설에서 자아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전법륜경』 등에서 발견되는 무아설, 즉 자아 부정의 가르침은 바라문교와 육사외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영원하고 축복으로 가득찬 내적 지배자로서의 자아’를 부정한 것이고, 『대반열반경』 등에서 발견되는 자아에 대한 가르침은 바라문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개별 중생으로서의 무상한 자아’를 연기와 중도의 진실에 따라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논자는 본 논문 2장에서 『우파니샤드』『사문과경』, 『제의증득경』 등를 중심으로 바라문교 및 육사외도가 주장하는바 자아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3장과 제4장에서 『전법륜경』 과 『대반열반경』 등을 중심으로 불타가 부정하거나 수용한 자아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 불타가 수용했던 자아를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전법륜경』 등에서 부정된 자아와『대반열반경』 등에서 수용된 자아의 차별성 및 불타가 자아를 설하면서도 그 존재를 승인하지 않았던 이유를 규명하고, 그와 같은 고찰들을 바탕으로 하여 ‘무아설’을 재정의해 보고자 하였다.
The Buddha’s concept of “non-self (anatta)” is one of Buddhism’s most distinctive teachings. While numerous scholars have previously studied this concept, it still leaves unresolved questions. The first issue, for example, involves the questio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lf as denied in the Dhammacakka-pavattana Sutta and the self as accepted in the Mahaparinibbana Sutta?” The second issue involves the question, “Why did the Buddha not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self, while preaching the concept of self in the Mahaparinibbana Sutta and elsewhere?” According to my research, the concept of “self” had various meanings in the tenets of Brahmanism and the six non-Buddhist masters who lived in the time of the Buddha. I think the teaching of non-self (or negation of the self)—found in the Dhammacakka-pavattana Sutta and elsewhere—is a denial of the “self as an internal ruler that is eternal and full of blessings,” as advocated by Brahmanism and the six non-Buddhist masters. I further think that the teaching of self—found in the Mahaparinibbana Sutta and elsewhere—is a critical acceptance of the “impermanent self as an individual being,” as advocated by Brahmanism and based on the truth of interdependent arising and the Middle Way.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various meanings of “self” as advocated by Brahmanism and the six non-Buddhist masters, focusing on the Upanishads, the Sāmaññaphala Sutta, and the Tattvārtha sūtra. Then, focusing on the Dhammacakka-pavattana Sutta and the Mahaparinibbana Sutta, I clarified the concept of self that the Buddha denied or accepted. Then, by examining the self that the Buddha accepted through the teachings of interdependent arising, I attempted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lf as denied in the Dhammacakka-pavattana Sutta and the self as accepted in the Mahaparinibbana Sutta, and the reason why the Buddha did not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the self while preaching it at the same time. Based on such considerations, I attempted to redefine the concept of “non-self.”
목차
I. 서론II. 바라문교와 육사외도가 주장하는 자아
1. 바라문교가 주장하는 자아
2. 육사외도가 주장하는 자아
III. 불타가 『전법륜경』 등에서 부정한 자아
IV. 불타가 『대반열반경』 등에서 수용한 자아
V. 불타가 수용한 자아의 연기와 중도
VI. 결론